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한다. 관계를 다지며 지친 삶을 달래고, 웃고 떠들며 환호하는 생동감이 커피로 맺어진다.
반면 착취와 억압이라는 인간성 실종의 그늘이 또 커피와 함께 한다. 커피로 인한 식민과 피식민 지배가 발생하고 심지어 일부 원주민들은 탄압과 토지까지 강탈당한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한 이같은 커피의 이중성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의 저자 마크 펜더그라스트는 커피의 일면을 다섯 가지로 분류, 분석했다. 그는 “커피 산업은 전 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구조의 형성을 좌지우지해 왔다”며 “수출작물에 치중하느라 자급농업을 포기함으로써 외국시장에 과잉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마크 펜더그라스트를 통해 커피의 다섯 가지 일면을 들여다 본다.
문화 : '혁명의 본부' 커피하우스
커피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격식을 차리는 하나의 문화다.
10세기에 페르시아의 한 의사에 의해 지면에 처음 언급된 커피는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대신 커피하우스가 문화의 장이 된다.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커피하우스는 커피가 15세기 말 이슬람권 전역에 소개되며 더 멀리 퍼진다.
프랑스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 선언 등 수많은 혁명을 선도하며 ‘혁명의 본부’라고 불린 커피하우스는 런던에만 2000여 개가 들어서며 1페니만 내면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 그곳에서 오가는 비범한 대화를 들을 수 있다고 하여 ‘페니 대학’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고주망태가 된 17세기 유럽의 남자들이 술을 깨기 위해 찾는 장소였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커피하우스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모이는 이들의 부류도 달라 나름의 색깔들을 만들어 냈다.
이후 세계 곳곳에 자리하다 1960년대 미국 군 기지 외곽에 퍼진 GI(미군) 커피하우스가 반군사주의 군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반전 커피하우스로 불리며, 저항의식을 싹틔우는 반항의 부화실로서의 커피하우스 역사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1890년대 중반~1900년대 초에 생겼다는 우리나라의 커피하우스는 현재 프랜차이즈와 개인이 직접 로스팅하는 소규모 커피하우스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스페셜티 커피를 좇는 사람들이 만든 제3의 물결을 넘어 농장주와 소비자의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4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전쟁 : 조지 한 잔과 씁쓸한 가루
커피를 전 세계로 퍼뜨린 일등공신은 전쟁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커피에 위안받던 군인들을 평생 중독시켜 버린 인스턴트커피 ‘조지 한 잔’은 그 중에서도 특 일등공신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브라질의 가장 신뢰할 만한 고객으로 등극한 미국은 군인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전쟁터에서의 커피를 잊지 못한 그들은 평생 커피 애호가가 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주도권을 갖게 된 미국은 커피의 주도권 또한 갖게 된다.
그렇다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내전에 깊숙이 얽혀 버린 커피는 어땠을까?
커피 가격의 하락과 농민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혁명을 부채질한 면도 있지만 독재자들의 자금줄이 바로 이 커피였기에 끔찍한 대학살에 희생당한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에게 커피는 눈물의 ‘씁쓸한 가루’였다.
커피를 마시며 그런 자금을 간접적으로 대 주던 커피 애호가들은 모르는 건지 모르고 싶었던 건지 그런 사실에 무관심했고, 농민 노동자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그것도 우리에게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는 1980년대에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독재가 폭력을 휘두르며 판을 치는 그런 시대로 기억되게 되었다.
무역‧국제정치 : 커피 값 ‘붙잡기’ 대 ‘올리기’
앞서 ‘전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커피의 주도권을 갖게 된 미국은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나중엔 아프리카도)와 커피 가격을 놓고 조율하며 미국인들이 유독 민감해 하는 커피 값을 붙잡아 두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라도 커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농장주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겨우 버티고 농민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 받기 위해 다른 일거리를 찾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도.
지금도 미국에서는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또 다른 음료인 콜라보다 훨씬 저렴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커피 가격이 늘 싼 값을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커피 생산 지역이 많지 않았던 시절의 커피는 농장주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쏠쏠한 아이템이었다.
커피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자 너도 나도 (베트남 같은 아시아까지) 커피나무를 심은 탓에 커피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훗날을 생각하지 않은 경작 방식에 땅은 황폐해졌다. 그러다 서리 같은 자연 재해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랐다. 이 오르는 가격을 보고 또 너도 나도 커피나무를 심어 풍작이 되면 커피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런 붐-버스트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새로 커피나무 심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커피는 또 다시 사방에서 쏟아졌다. 점점 떨어지는 커피 가격 때문에 생산국끼리 수출량을 제한하자는 정책도 펼치지만 그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곤 했다.
그 와중에 허먼 질켄이라는 굵직한 커피업자가 커피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의 가격 안정책을 돕는다며 커피 원두를 사들여 처음엔 브라질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훗날 그 원두를 되팔아 큰 이익을 보고 정작 브라질은 비싼 이자와 창고 보관료를 지불하며 손해만 봤다.
하지만 그러던 브라질도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 갔다. 잘 익든 안 익든 한꺼번에 싹 쓸어 수확해 커피 질을 떨어뜨렸던 그들이 이제는 재배 기법이나 수확 방법을 개선해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려 하고, 공정무역 등의 운동을 펼치며 커피 농장주나 농민 노동자들도 제값을 받고 커피를 팔 수 있는 경로가 생기면서 그런 농장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 커피 (마케팅) 전쟁
커피의 역사는 광고와 마케팅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커피업계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크거나 사라졌다. 때로는 커피 브랜드 끼리, 때로는 커피 대용품이나 콜라에 맞서면서.
그 치열한 고민은 커피로 하여금 마케팅과 광고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곤 했다. ‘1센트 반환금’이라는 문구가 찍힌 상품교환권을 모아 솔깃한 상품과 바꿀 수 있게 한 마케팅부터 경품을 먼저 주고 물건을 사 쿠폰을 채우는 ‘선증정 경품’ 프로그램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케팅이 있는 반면 커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공팩을 도입한 힐스브라더스는 진공팩 겉면에 “밀봉을 뜯지 않는 한 신선도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문구를 떡하니 넣으며 과대광고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허나 커피의 과대광고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남북전쟁 한참 후에 만들어진 맥스웰하우스 커피는 유서 깊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수년 전 북부와 남부는 이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형제애를 맹세했”다며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카페인이 없는 커피 대용품 ‘포스텀’을 광고한 포스트는 광고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인물에 속할 정도로 광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커피 광고인들은 이에 맞서 고전하다 백 세가량 되는 고령의 커피 애호가를 찾아 그들의 장수 비결이 커피라고 선전했다.
커피 광고인 리저는 “광고란 새로운 판촉 조건에 따라 계속 진화하는, 경제적인 판매 방식”이라며 신문, 잡지, 광고판, 전차 등의 광고 매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이들 커피 광고인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 내 그것을 광고에 반영했고, 때론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커피 생산국의 마케팅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는데, 콧수염에 전통 농민 복장을 하고 노새를 옆에 둔 후안 발데스가 커피 농장을 일구는 모습을 보여 준 광고가 그것이다.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커피 한 잔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값비싼 보살핌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해 주어 콜롬비아 커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콜롬비아 커피를 세계 최고의 커피로 인정하는 소비자 수를 300퍼센트나 늘게 했다.
스페셜티 커피 : 제3의 물결 속으로
지금의 커피 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은 스페셜티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만든 커피하우스에서 스타벅스라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 만들어졌고, 제대로 된 커피 맛을 찾는 고메이 운동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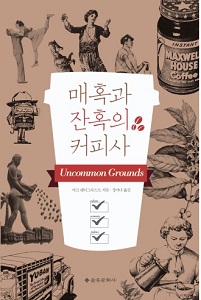
이들 개인이나 업체를 비롯해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 산하기관인 커피품질연구소 등은 고급 커피 원두를 만들어 내기 위해 농민 노동자를 직접 교육하거나 학교를 세우고, 대출을 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질이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철새를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그늘 재배를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모든 고가의 좋은 커피가 제값을 치르며 구입한 원두로 만들어 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한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그래서 커피가 씁쓸하지만은 않은 꽤 괜찮은 음료가 되고 있다.


